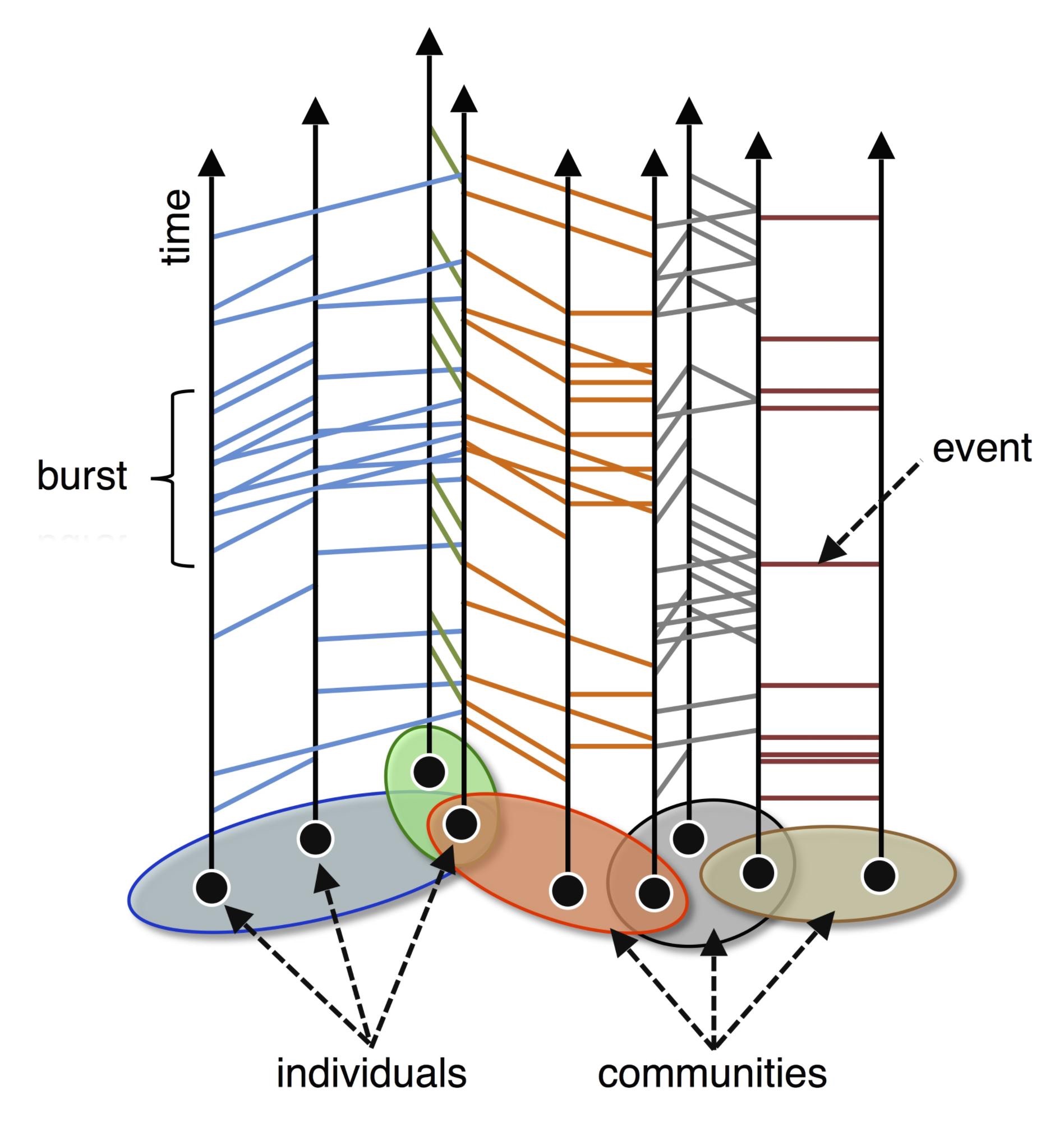오늘 저녁 서울의 아무 곳 13호실에서 사회물리학에 대한 열띤 이야기가 오고갔다. 물리학이 사회현상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짧고 허잡한 글을 내가 준비했고, 그동안 모호했던 지점들이 조금이나마 드러났고 논의되었다. 그 내용을 내멋대로 정리해보겠다.
통계물리학의 단순한 모형을 이용하여 복잡한 사회현상의 특정한 결과를 재현해냈다면, 물리모형이 사회현상의 핵심적인 특징을 잘 반영했다고 할 수 있나, 아니면 끼워맞추기에 불과한가? 통계물리학에서 주로 연구되어온 모형들은 물리현상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상호작용하는 다체계라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를 이루는 행위자들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단순화하여 잘 정의한다면 통계물리의 성과들을 이용하여 사회현상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문제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단순화할 때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있다. 복잡한 물리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환원주의 방법론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사회현상은 물리현상에 비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물리학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정당화'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는 여기에서 사회심리학 같은 학문의 결과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자물리학이 근본 입자와 이들 사이의 근본 힘을 규명하고 그 바탕에서 입자들의 집합적 행동이 통계물리에 의해 연구되듯이, 사회물리학은 사회의 행위자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공허해질 뿐이다. (물론 사회열역학처럼 처음부터 거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기는 하다.)
이를테면 1998년과 2000년의 브라질 선거 결과를 통계물리 모형으로 재현해낸 연구결과가 있다. 투표자의 행위를 극도로 단순화시켰지만 실제 현상의 특정한 결과를 잘 재현해냈다. 하지만 이들에게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미시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정당화는 없다. 나는 직접 브라질에 가서 투표자들의 행동과 심리를 조사하여 위의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물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는 결국 자신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공평무사하게 객관적인 사실은 없다는 말이다. 또한 과학적 방법 역시 결국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현장조사가 과연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하는 얘기까지 해볼 수 있다. 이쯤에서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는 것 같다.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물리학에는 4개의 맺음변수만 있으면 뭐든 설명해낼 수 있다는 얘기(four-parameter theory)가 있다. 어떤 박사님의 글에서 본 말인데 거기에도 명확한 출처가 없다. 모형에 변수가 많아지면 현실에 더 잘 맞출 수는 있지만(fitting) 다루기도 힘들어지고 수식을 풀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맞췄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 세상에 100만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걸 수십개로 줄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싶다.
정리를 하다보니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경향도 있고, 한 줄기로 생각을 정리하다보니 제기된 다른 여러 문제들을 제쳐뒀다가 잊어버린 느낌이다. 그래서 결론은? 없다.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