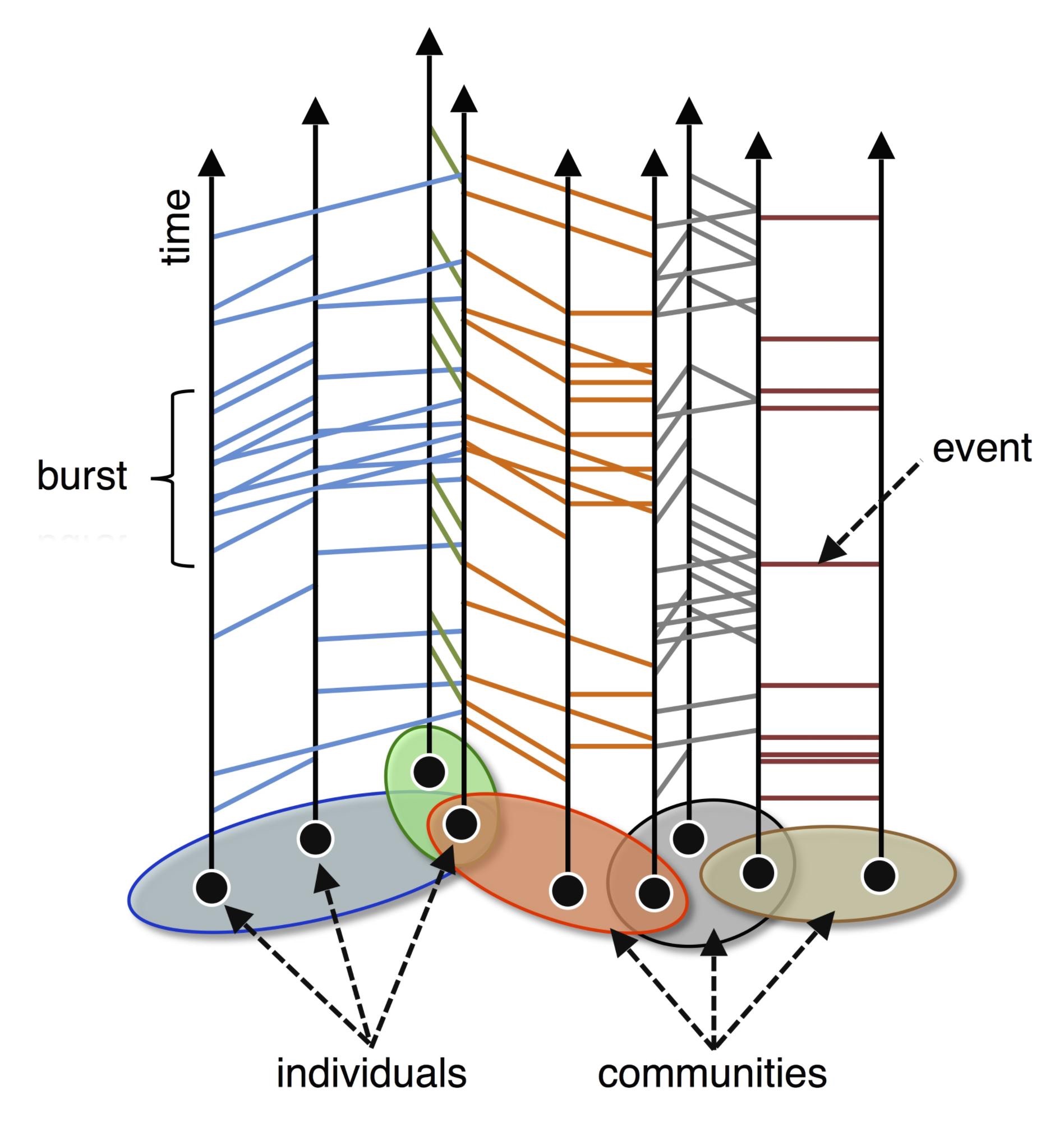티스토리에 블로그를 새로 연 때가 3월 23일, 첫 글을 쓴 때가 다음날인 24일이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휘리릭 지나가버렸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3년 넘게 있다가 티스토리로 옮겼는데, 뭐랄까 온실에서 야생으로 나온 기분이었다. 물론 설치형이 아니므로 완전한 야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설치형은 야생이냐...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다.
네이버도 시즌2를 시작하며 사용자가 디자인과 기능을 좀더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게 했는데, 티스토리나 태터툴즈나 그러한 자유가 더 커진 것 같다. CSS 매뉴얼을 찾아가며 원하는 부분의 디자인을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경로로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는 '리퍼러 기록', '키워드 통계' 같은 기능들을 이용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왜' 나의 블로그에 오게 되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는 것.
지난 한 달 동안 보아온 결과, '(하이더의) 균형이론'이 꾸준히 리퍼러 로그 검색어와 키워드 순위의 상위권에 나타났다. 또한 '한미 FTA'나 '히포크라테스 선서', '조승희 총기난사' 등이 상위권이었다. 사실 '복잡계'나 '물리'에 초점을 맞춰 이 블로그를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관련 글을 많이 올리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이므로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과 사람들이 찾는(수요) 내용의 차이가 있음을 제대로 확인했다. 네이버에 있을 때에도 내 글 중 스크랩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코즈의 거래비용'에 관한 내용이었다.
웬지 더 넓은 세상에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또 지내다보니 이 동네도 그냥 동네구나 하는 생각도 '섣불리' 해본다. 사실 아직 그런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다. 네이버에 비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회적 연결망 안에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이웃블로거'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또 그만큼 쉽게 잊혀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아무리 익명의 그늘에 숨어있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이 그리운 법이다. 다만 내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만 드러냄으로써 현실과는 다른 모습의 나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연결망 속의 나.라는 안정감이 아쉽다. 적어도 네이버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이웃추가가 가능하고 전체공개/이웃공개/서로이웃공개/비공개 등의 공개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내게 중요한 이웃과 그렇지 않은 이웃을 구분지을 수 있는 장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지? 하여간 뭐든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RSS 피드라든지, 링크 걸기 등을 통해서 그러한 연결망을 만들 수도 있다. 나도 티스토리로 옮기면서 한RSS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한다고 해도 네이버의 '이웃블로거'라는 친밀감을 느끼기가 힘들다.
한 달 하고 이틀 정도 더 지나는 동안 새로운 밭(field)을 일구고 잡음(noise)섞인 씨를 뿌렸다. 예전에 썼던 글을 다시 옮기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그냥 1/f 노이즈라는 이름을 붙인 카테고리에 넣어두었다. 뭐 일단은 계속 가보는 거다. 다만 중독은 피하도록 하자.고 되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