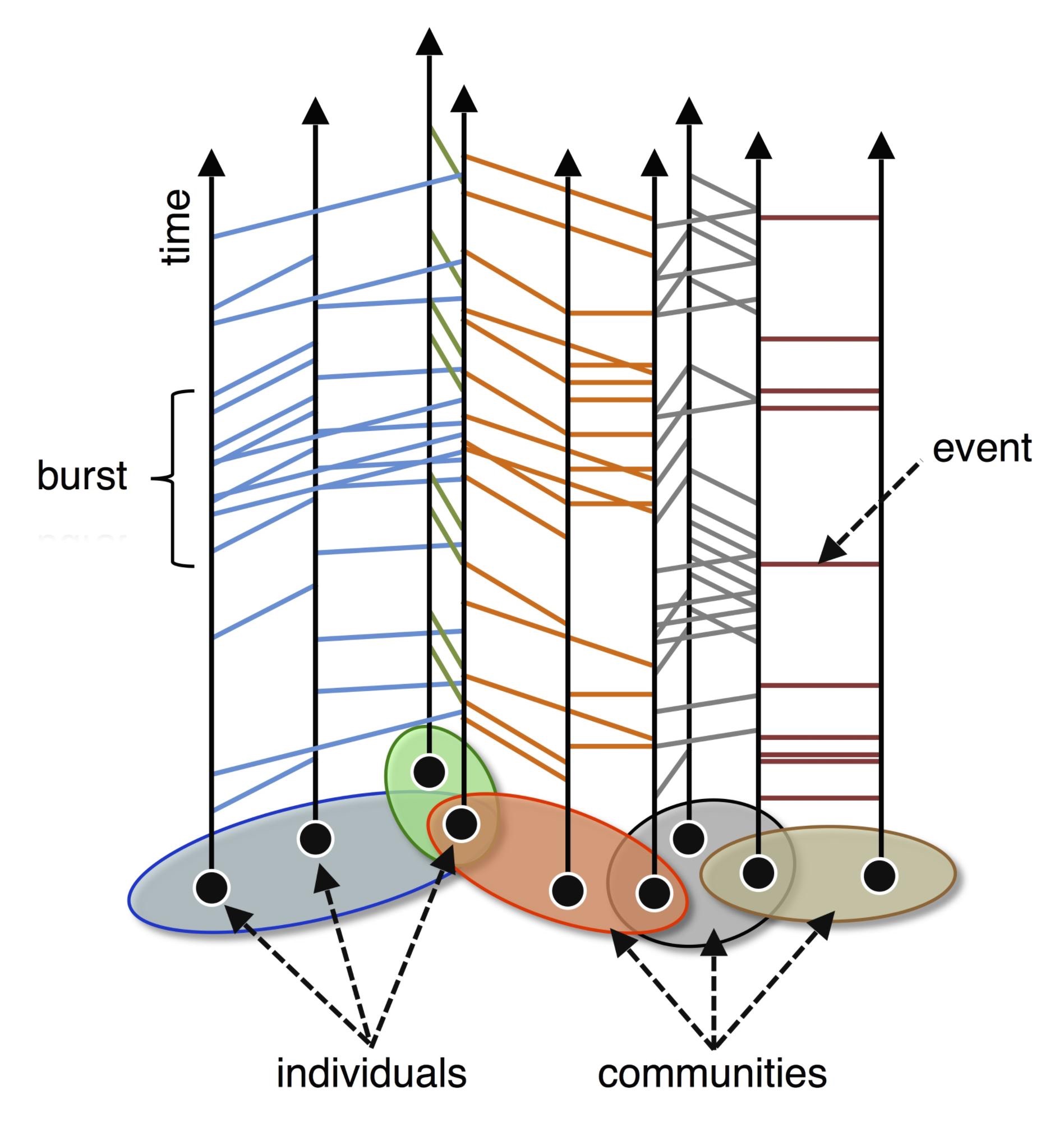뷰리단의 당나귀는 당근을 앞에 두고 먹을지 말지 고민하다 굶어죽었다는 당나귀에 붙여진 이름이다. 위키피디아의 Buridan's ass 항목을 보면, 완전히 동일한 가치를 지닌 두 대안의 정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 당나귀가 왼쪽의 먹을 것과 오른쪽의 마실 것 사이의 정확히 가운데 있는 경우 굶어죽을 것이라는 얘기다. 뷰리단은 14세기 프랑스 철학자의 이름을 딴 것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서 처음 나온 얘기라고 한다.
내가 이 당나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0년전 어떤 철학과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였다. 이 당나귀는 빛의 속도로 내 머리를 강타했는데(이런 과장법이라니;;) 내가 바로 뷰리단의 당나귀처럼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 100원짜리 동전 두개를 들고 동네 문방구 가게 앞에 서서 어떤 조립식 장난감을 살까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일이다.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종종 그런다. (지금은 조립식 장난감을 갖고 놀지는 않는다.)
그때 난 왜 그랬을까. 당시에 내가 왜 그랬는지 알 길은 없지만, 돈을 아껴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주입받은 것일테지) 하나를 사더라도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것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일들로 미루어보건대 그때부터 뭔가 따지기를 좋아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같다.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찾거나 시도해보거나 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안주하는 성격과도 관련되는 것 같다. 만일 그때 나에게 돈이 조금 더 있었다면 이것도 사보고 나중에 저것도 사보고 했을까. 그래서 더 많이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풍부한 사람이 되었을까. 부질 없는 가정이다.
뷰리단의 당나귀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완벽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비합리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고민만 하다가 굶어죽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 타당한지도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내가 스스로 뷰리단의 당나귀였음을 알기 1년 전부터 나는 이미 내 안의 벽을 깨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러기까지도 여러 계기들이 있었고, 그 벽을 깨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도 있었다. 뭐... 다 그렇게 크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어물거리며 서둘러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