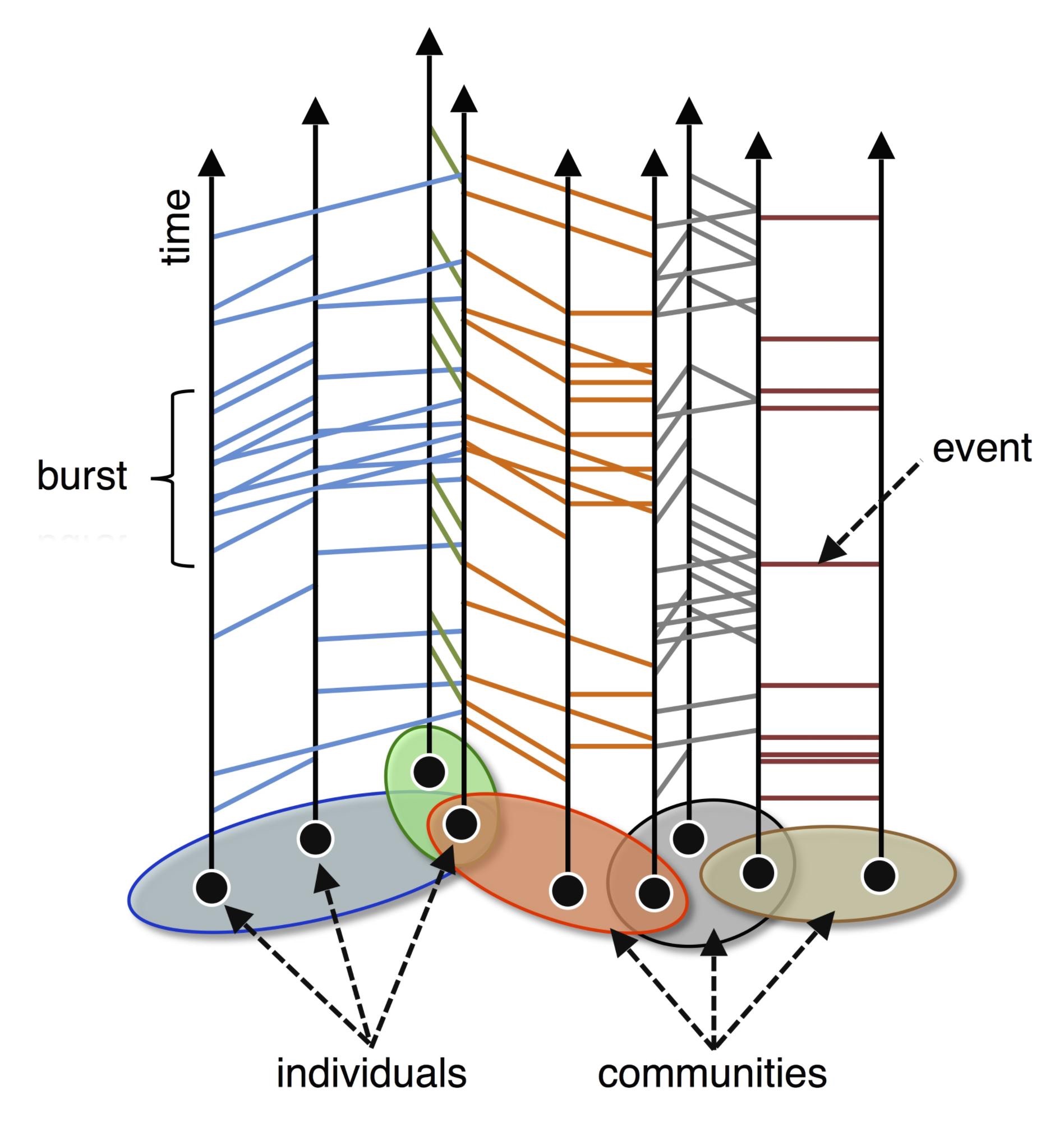그가 처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의 그 충격을 그는 아직도 기억한다. 세상의 복잡성은 그의 눈으로는 감히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거대한 성 같았다. 하지만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살아 있기에 세상과 관계 맺고 있기에 세상이라는 문제를 어떻게든 이해하지 않고는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가 학교에서 처음 배운 것에 따르면 세상은 완전했고 또한 조화로웠다. 세상에는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이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문제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질문이 생겨났다. 규칙도 완전하지 않았고 만들어진 규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는 사람들과 이미 있던 규칙을 없애려는 사람들 사이의 수많은 논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공평무사한 규칙이란 없으며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이 연관되어 있었다. 가까스로 이끌어낸 합의조차 쉽게 무시되거나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뿐이었다.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혼돈이 혼돈만을 뜻하지는 않았다. 혼돈 안에도 다른 형태의 규칙이 있었다. 특히 ‘초기 조건에 민감한 반응’이라는 개념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선택이 먼 훗날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 개념은 그로 하여금 어떤 것이든 쉽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은 그에게 굴레가 되었다.
또 많은 시간이 흐르고서야 그는 세상은 혼돈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차이를 벌리기만 하는 양의 되먹임뿐 아니라 차이를 좁히려는 음의 되먹임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세계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음의 되먹임이 강한 현상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이 한 곳으로 모이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것들의 분포를 구해보면 평균이 잘 정의되었으며 편차는 보조적인 도구일 뿐이었다. 반면에 양의 되먹임이 강한 현상에서는 서로 다른 것들은 더욱 더 달라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평균에서 점점 멀어지는 성향이 보였다. 그에 따라 편차도 더욱 커지다가 평균이라는 값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발전하기도 했다.
그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분포를 구해보았다. 음의 되먹임이 강한 경우에는 정규분포나 뿌아송 분포 등을 발견했고, 양의 되먹임이 강한 경우에는 흔히 두꺼운 꼬리로 불리는 분포들을 발견했는데 그중에서도 거듭제곱 분포가 눈에 띄었다. 거듭제곱 분포는 다른 분포와는 다른 특이한 성질이 있었는데, 부분을 확대해도 전체와 비슷한 모양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비슷한 모양, 비슷한 성질, 비슷한 패턴.
그는 이러한 ‘자기유사성 구조’를 아름답다고 느꼈다. 관찰자로서 관찰대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싶은 욕망은 자기유사성 구조라는 대상을 통해서 절대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거기에는 늘 틈이 있으며 그 틈 안에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미 전체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 틈 안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가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충족되지 않은 욕망은 관찰자에게 긴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아름다움의 원인이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 다음 글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