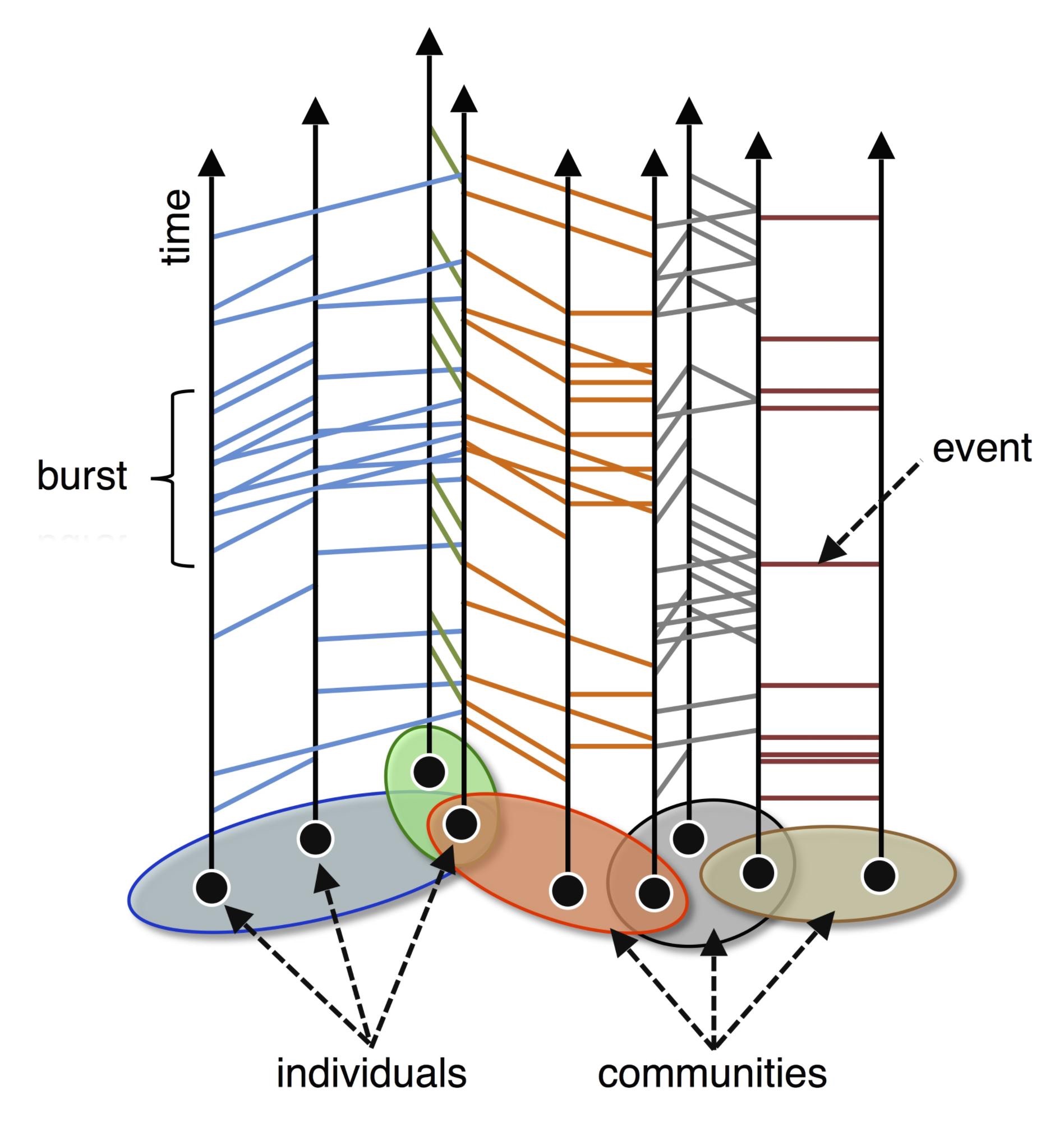예전부터 여기저기 포스터가 많이 걸려 있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볼 기회가 없어서 보지 못했던 영화들이 있는데 뤽 베송 감독의 1988년 영화 <Le Grand Bleu>도 그 중 하나다. 무려 2시간 48분이나 하는데 그러고보니 무려 거의 20년 전 영화이기도 하다. 또 우연히 주요 배경이 시칠리 섬인데 7월에 참가할 학회가 열리는 곳이라서 기분이 묘했다.
모니터는 크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펼쳐지는 지중해와 그 아래는 너무도 깊고 신비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정말 깊은 곳에는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다.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곳에서 그들은 사랑하고 싸우고 슬퍼하고 또 기뻐하지만 그들이 정말 진실할 수 있는 곳은 바다속 깊은 곳,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돌고래가 사는 곳이다.
위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영화 속의 돌고래들도 훈련을 받았을테고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먹이였을지도 모른다. 돌고래는 똑똑하다고 하니(<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따르면 말이다)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신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바다 깊은 곳, 수압이 너무 높아 숨조차 쉴 수 없는 그곳은 내가 즐겨(?) 상상하던 곳이기도 하다. 그와 대칭을 이루는 곳이 있으니 우주 저 높은 곳, 압력이 너무 낮아 역시 숨쉴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난 어떻게 될까? 비늘도 날개도 없이 태어난 나는 그저 이곳 사막에서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쩌랴, 낙타로 태어났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