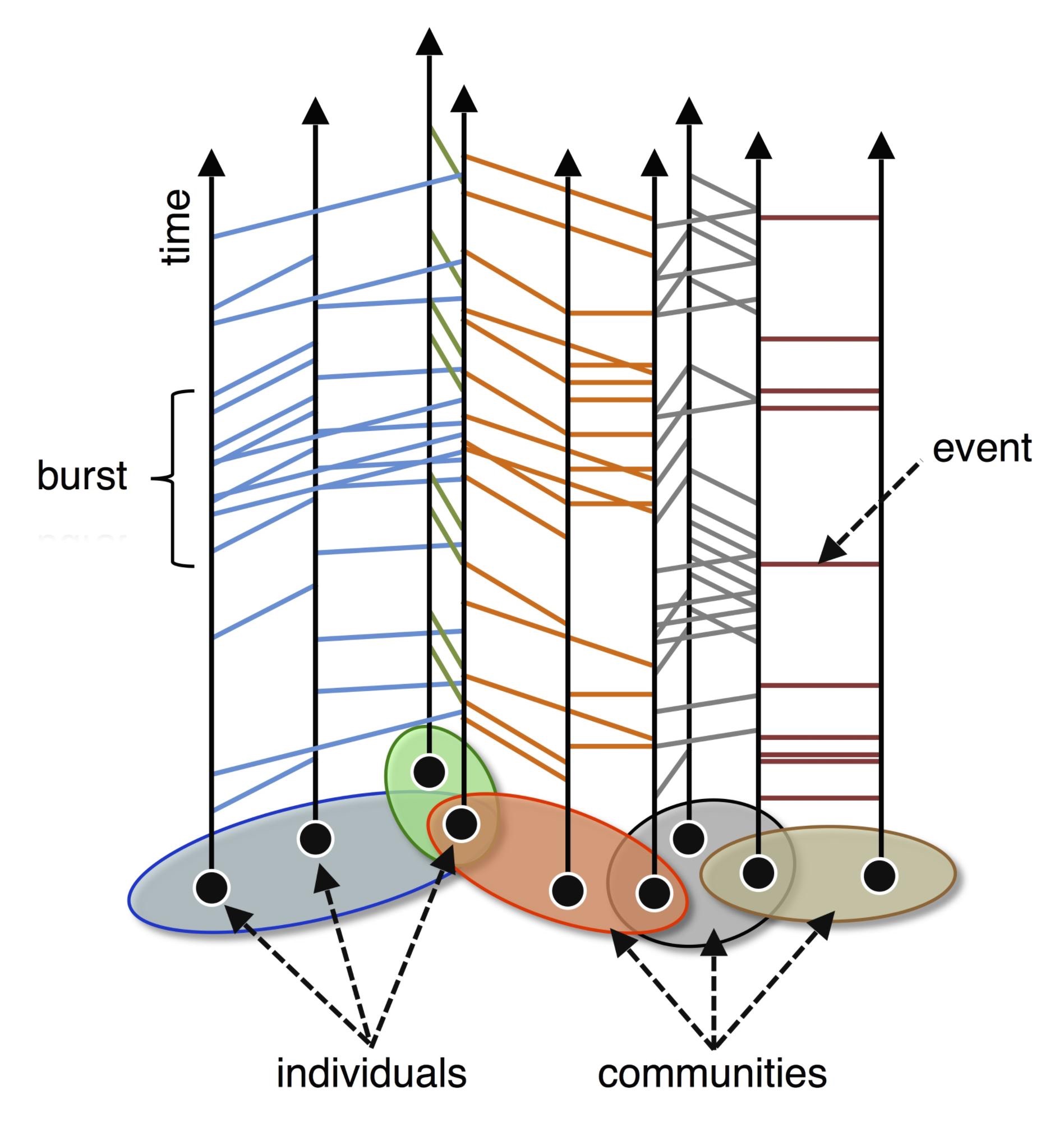* 2005/03/16
이웃블로거 '루체'님의 블로그에 갔다가 읽은 글을 보고 엮인글을 쓴다. 원래 제목은 "How to Build an Economic Model in Your Spare Time"이고 아래 페이지에 가서 '2003 and earlier, Non-technical papers' 목록의 마지막 글을 보면 된다. [방금 다시 가보니 '2004 and earlier'로 바뀌었네요.]
http://www.sims.berkeley.edu/~hal/people/hal/papers.html
pdf 파일을 다운받아 인쇄하니 16쪽인데 그리 길지 않은 편이고 무엇보다 편하게 썼고, 더욱이 요즘 나의 고민들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경제모형을 세우는데 관심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경제학도도 아니므로 물리학도를 위해 약간의 변형이나 첨삭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두면 좋을 내용들이라고 생각한다.
얘기를 시작하자면. 아이디어를 얻는데 학문적인 저널을 보기보다는 신문, 잡지, 대화, 티비,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찾으라고 충고한다. 물론 저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만을 뒤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록 이미 누군가가 해놓은 연구를 '재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직관, 통찰력, 접근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한다.
아이디어를 잡았으면 그것이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아이디어가 옳다면 그로부터 어떤 결론이나 응용이 따라올 것인가? 그것이 많은 것을 암시하는가 아니면 단지 막다른 골목일 뿐인가? 아주 내 가슴을 콕콕 찌르는 글귀였다.
이 단계에서 또다른 충고는 문헌조사를 너무 빨리 시작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앞에 이미 써놓았듯이, 문헌을 찾기 전에 혼자서 모형을 발전시키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미 연구된 것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해야만 다른 연구를 접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비약을 해보자면, 그래서 역사는 늘 새롭게 씌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제 모형을 세워야 하는데 경제 행위자,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 제한된 조건 등 어느 정도 일반적인 틀이 있을 것이다. 모형을 세웠으면 간단한 예제를 통해 그것을 시험해보는 일을 해보아야 한다. 모형은 가능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걸 KISS라고 하는데 keep it simple, stupid의 약자다.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단다. "모든 것은 가능한 단순해져야 한다. 하지만 더 단순해져서는 안된다.(everything should be as simple as possible ... but no simpler)"
그 다음으로는 모형을 일반화해야 한다. 처음의 아이디어의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가장 단순한 모형을 세웠으면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구체에서 추상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구체화를 시도하려는 것 같다. 다만 처음의 구체는 하나의 구체적 사례이고 나중의 구체화는 보편으로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겠다. 글쓴이는 이러한 과정을 조각에 비유하는데 커다란 대리석을 깎고 깎고 깎아내는 것으로 모형화를 설명한다.
이제 문헌조사를 하면 된다. 이미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연구를 해놓았다면 그것과 자신의 모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본다. 자신의 모형이 더 일반적이라거나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런 연구가 문헌조사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틀렸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는 세미나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청중과 소통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내용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 출판을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 대충 넘어가려 했는데 그래도 대충이라도 소개해야겠다.
세미나 발표는 소개, 내용, 결론으로 이루어지는데 소개는 되도록 짧게 하라고 한다. 사람들은 어짜피 발표내용의 앞부분만을 기억할 것이므로 지루하고 장황하게 소개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아는 것이면 대답하면 된다. 모르는 것이거나 핀트에 어긋난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다시 얘기해보죠." 그리고나서 얘기하지 않으면 된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한다. 앞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 가운데는 소수만 아는 내용,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다. 논문을 쓸 때에도 발표를 할 때처럼 장황하게 쓰지 말고 읽는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하고 곧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라고 충고한다. 시작을 했으면 또 멈출 줄 알아야 하는데 일단 하려는 얘기를 했다면 거기서 멈추라고 한다. 많은 논문들이 할 얘기를 해놓고도 이리저리 사설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가끔 어떻게 저런 모형을 생각해냈을까, 어떻게 저런 사안을 연구할 생각을 했을까 하며 놀라는 경우가 많다. 정통 물리학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사회물리나 경제물리 쪽에서는 무궁무진한 소재들이 널려 있다. 무엇이 중요한 함의를 가지며 무엇이 골목길의 끝인지 판단하고 큰 줄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잡아 모형을 세우는 일. 요즘 나의 고민인데 그래서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글이었다. 루체님에게 감사를.
---
1. 원래 '짜투리 시간'이라고 썼는데 표준어가 아니란다. 그래서 제목을 '자투리 시간'으로 바꾸었다.
2. 고율님 블로그의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