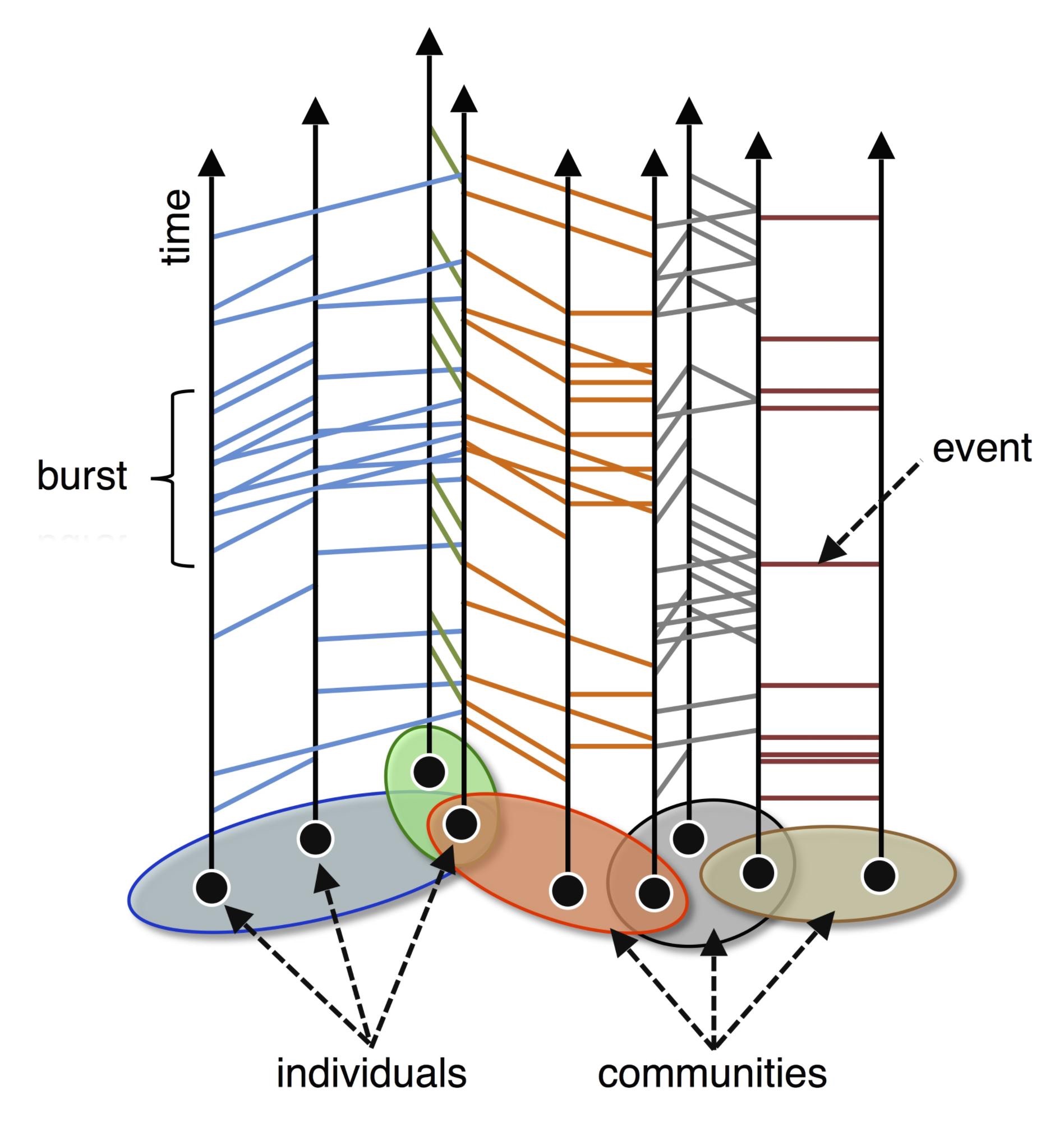19세기 중반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를 정의하고, 열역학 제2법칙이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정립되던 시기에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현상은 거시적인 현상이었다. 원자의 존재가 '가설'로서만 존재했던 시기였고 열기관이나 관련 실험들의 시스템 크기는 아보가드로 수(10의 23제곱) 정도였다. 비가역적인 과정에서 엔트로피 증가는 법칙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볼츠만이 원자가설에 근거하여 엔트로피에 대한 미시적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 감소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나자 그토록 공격받았던 것이다.
어쨌든 볼츠만과 깁스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성과 위에서 열현상의 미시적 이해로서의 통계역학이 자리를 잡았고 다체계(many-body system)를 다루는 곳이면 어느 분야든지 통계역학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점점 더 미시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법칙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이른바 '열역학적 극한(thermodynamic limit; 시스템의 크기를 무한대로 보냄)'에서는 엔트로피 증가법칙이 성립하지만, 유한한 크기, 특히 매우 작은 크기의 시스템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론과 실험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엔트로피 감소는 열역학적으로 열을 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인데, 특히 미시적인 생명체 또는 생명기관의 효율과 연관지어볼 수 있다. 어쩌면 슈뢰딩거의 '네겐트로피(negentropy; negative entropy의 줄임말)'라는 개념 없이도 생명현상의 자기조직화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즘 계속 머리 속에 떠다니는 생각들인데, 앞으로 계속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주제다. 한 가지만 더 말해보자면, 가역성/비가역성에 관한 것이다. 애초에 가역성/비가역성은 어떤 시스템을 하나의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변화시켰다가 되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지만, 여기에 '시간의 화살'이라는 개념이 얽히면서 복잡해진 것 같다.
엔트로피 증가법칙도 '상태공간 상의 어떤 경로에 따른 증가'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 경로를 따라가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간에 따른 증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시간 가역성이나 시간 비가역성은 어떤 현상이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에도 똑같이 관찰되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다. 사실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장치가 발명되지 않는 이상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라는 상황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그에 관해서는 사고실험만 가능할 뿐이다. 어쨌든 '상태공간 상의 경로에 관한 가역성/비가역성'을 '시간 가역성/비가역성'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